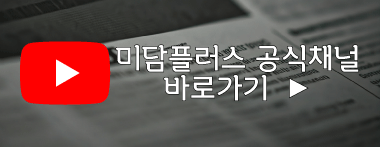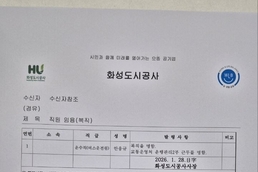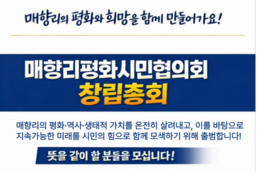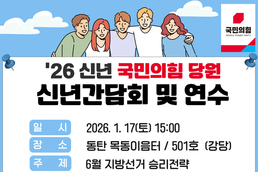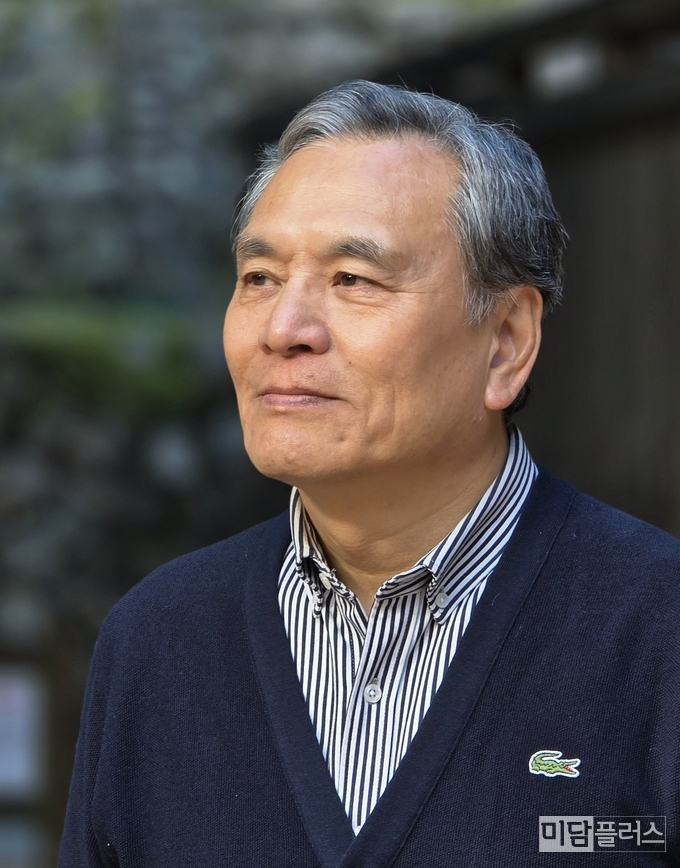
창밖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유리창 위로 길게 드리운 햇살. 그러나 이 장면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계절은 언제나 한발 앞서 움직이며, 자연은 말없이 다음 빛을 준비한다. 그 순환은 인간의 삶을 비추는 가장 오래된 거울이다. 이맘때가 되면 수첩에 적혀 있던 일정들이 하나둘 지워진다. 채워졌던 칸이 비워질수록 시간은 더 또렷해지고, 기억은 조용히 과거의 서랍 속으로 밀려난다. 인생의 절기와 맞물려 겨울은 늘 허무의 얼굴로 다가온다. 그러나 겨울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떠난 이를 다시 불러 마음속에 앉히는 위령의 시간이기도 하다.
사 년 전 겨울, 나는 장례식장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목관 하나가 세상과 저세상을 가르고 있었다. 영혼이 떠난 몸을 실은 관이 움직이던 순간, 우리는 더는 고인에게 닿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 문턱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경계였다. 작은 철문이 열리고 관은 불가마로 들어갔다. 숨죽인 오열과 삼켜진 한숨들 사이로 정적만이 깊게 내려앉았다.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듯, 장모님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우리 앞에 놓였다. 화부는 스피커로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미 팔십 평생의 삶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난 뒤였다. 그 재는 아직 식지 못한 온기를 품은 채, 과거의 시간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다. 삶이 잿빛 가루로 남기까지의 과정을 애써 붙잡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다시 불러내고 싶은 기억의 조각들은 쉽게 놓아지지 않는다. 남겨진 자로서 고인과 함께했던 시간을 가족들과 나누는 일은 슬픔을 견디게 하는 가장 단단한 위로가 된다.
사 년 전 유월, 장모님께서는 말기 암으로 진단받으셨다. 삶의 색은 한순간에 바래고 집 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졌다. 병실에는 늘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지만, 장모님은 아픈 몸으로도 가족의 안부를 먼저 물으셨다. 그 몇 달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나, 병은 깊어졌고 그해 겨울 장모님은 떠나셨다. 그 시간은 내 마음속에서 끝내 이어지지 못한 점선으로 남아 있다. 함께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빚이 그 점선을 더 길게 늘인다. 그 무렵 아내 또한 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장모님의 병구완과 자신의 치료를 동시에 견뎌야 했던 아내의 뒷모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다. 남은 자의 고통은 이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삶을 따라온다. 겨울로 접어들면 산천의 빛은 한결 낮아진다. 가지 끝에 남아 바람을 견디는 잎 몇 장. 그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차가운 계절을 건너온 삶의 흔적이다. 모든 것이 비워진 자리에서 오래 남는 것이 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다. 언젠가는 모두 허무로 흩어지겠지만, 그 허무 속에는 뜨겁게 살아낸 흔적이 남는다. 사랑했던 기억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 들, 말없이 건넸던 손길 하나까지. 그것들은 장모님의 삶을 증명하는 잎새이며, 남겨진 우리가 다시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다.
겨울은 더욱 깊어져 가고 찬 바람은 서서히 낮아지며 봄을 예고한다. 아직 허무의 그림자는 짙지만, 그 속에 따뜻한 불씨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 불씨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 그것이 남겨진 자의 몫이다. 그해 겨울의 잿빛 허무는 결국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또 하나의 계절이 되었다.
2026년 1월 30일
그해 겨울을 기억하며
◀ 김 종 걸 ▶
○ 격 월간지 〈그린에세이〉 신인상으로 등단
○ 작품집
수필집 : 〈울어도 괜찮아〉(2024)
공 저 : 〈언론이 선정한 한국의 명 수필〉(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