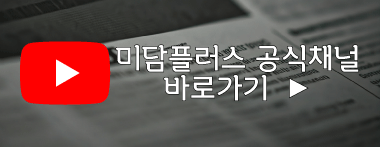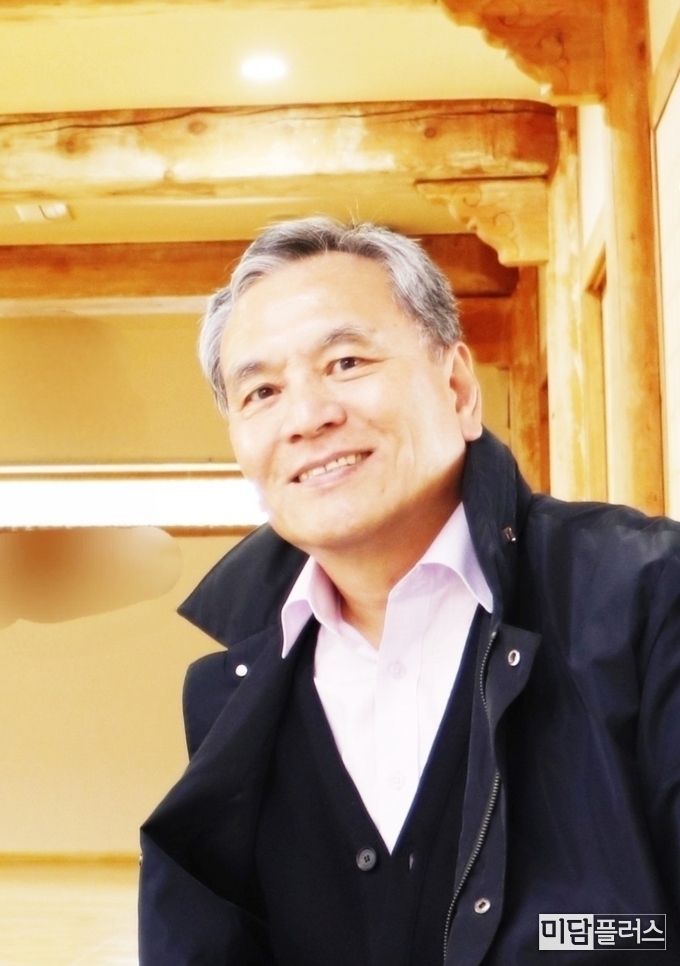
이른 아침, 창문 밖으로 익은 감빛 햇살이 스며든다. 바람은 서늘하고, 먼 들녘엔 국화 향이 은근히 번진다. 커튼 틈새로 들어온 빛이 방 안을 살짝 물들이고, 하늘의 구름은 느릿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고요한 순간마다 내 마음의 온도 또한 천천히 익어간다.
아침의 정적은 언제나 내게 한 편의 기도와 같다. 시계의 초침마저 조용히 멈춘 듯, 세상은 잠시 말을 아낀다.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준비한다. 아직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은 시간, 그 적막의 틈에서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깨어난다.
요즘은 책을 읽는 시간이 좋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혼자 머무는 그 순간이 좋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마음이 가라앉고, 세상의 소음이 멀어진다. 그때 비로소, 다시 돌아오는 기분이 든다.
며칠 전 읽은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이라는 책은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원로 작가 101인의 가상 유언장을 엮은 책인데, 한 작가는 “글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못한 삶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 고백한다. 작가적 양심을 지키지 못한 채, 변명과 미사여구로 자신을 꾸며온 세월을 참회하는 대목에서 오랫동안 침묵으로 묵상에 들었다. 그 고백이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문단 수필 등단의 소감문에 “늘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한 가닥의 마음이라도 흔들릴 때 수필은 좋은 길벗이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을 지키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았다. 흔들릴 때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타인의 눈이 아닌 양심의 눈으로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다. 그 눈앞에서는 작은 위선조차 숨을 곳이 없다. 가끔 그 눈빛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그 부끄러움이 내게 글을 쓰게 했다.
‘작가’라는 이름 앞에서 마음이 작아질 때가 있다. 아직도 내 글 하나 내놓기에 부끄러워, 바쁜 직장을 핑계로 삼았다. 그래서 스쳐 간 이들에게 고개 들기 어려울 때도 많았다. 하지만 이젠 그럴 핑계조차 만들 수 없다. 타성에 젖은 일상이 위선과 허세로 물들지는 않았는지, 요즘은 가끔 스스로 돌아본다.
며칠 전, 지인 모임이 있어 서울에 다녀왔다. 누군가 물었다. “읍내에서 사는 게 적적하지 않아요? 지겹지 않아요?” 나는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아 그저 잠시 침묵하다 작은 미소로서 응답했다.
고요한 아침의 자연이 그리워 돌아온 내 마음을 그들이 어찌 이해하랴. 시골의 고적한 아침 속에서 글을 쓰고, 가끔 바닷가를 거닐며 느끼는 소박한 행복을 그들에게 말해봤자 공허할 뿐이다. 다들 뙤약볕 아래 농부의 손길을 고생으로만 여기겠지만, 그 속에서 생의 단순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농사란 단순히 ‘하나를 심어 열을 거두는 일’이 아니다. 흙의 냄새, 땀의 의미,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는 순한 삶의 도리, 그 모든 것이 마음의 농사다. 봄에는 새순이 올라오는 기적을 보며 감사하고, 여름에는 비를 맞으며 자라는 푸르름에 마음을 씻는다.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익어가는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겨울에는 흰 침묵 속에서 다음 생의 씨앗을 품는다.
자연의 순리는 언제나 삶의 본보기가 된다. 세상의 이치가 단순하듯, 마음의 이치 또한 그 단순하다. 비 오는 날이면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빗줄기의 정취에 귀를 기울인다. 방울져 떨어지는 빗소리는 내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듯 맑고 투명하다. 그 소리 속에는 위로가 있다. 인간의 언어가 닿지 못하는 자리에서 자연은 묵묵히 말을 건다. 삶에 지친 우리에게 맑은 위로의 소리를 들려준다.
가을엔 해가 짧다. 여름날처럼 더디고 더딘 걸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곳의 시간은 점점 늘어만 간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고, 하루의 끝이 자연스레 저문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벽에 기대고, 이웃의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지나간다. 그 평온이 내 삶의 리듬이 되었다.
저녁이면 등잔불 같은 노을이 하늘을 덮는다. 그때면 하루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마음속에 고요가 내려앉는다. 어머니의 밥 짓는 냄새처럼 따뜻하고 오래된 평화가 찾아온다. 살아간다는 건, 어쩌면 매일 조금씩 ‘익어가는 일’일지도 모른다. 미숙했던 마음이 햇살에 드러나고, 서툴렀던 사랑이 바람에 다듬어진다. 성숙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제빛을 키워가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깃든다.
이제는 안다. 외로움과 자유는 결국 한 뿌리에서 돋은 잎사귀임을. 고요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며,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여백이다. 세상의 빠른 흐름에서 벗어나 오히려 천천히 살아갈 때, 삶은 비로소 제맛을 드러낸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인가 종종 부모님이 뵙고 싶다. 꿈에서라도 뵙고 싶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늙어봐야 부모 생각날 것이다.”라던 어머님 말씀이 가슴 깊이 사무치는 건 내가 늙어 외롭다는 증거일 테다.
오늘도 조용하고 쓸쓸한 방안에 아침의 햇살이 비춘다. 그 빛을 바라보니 아버님의 진회색 두루마기 동정처럼 그리움이 더 사무친다. 늘 행복한 생각을 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나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그걸로 족하다. 익어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도 조금씩 깊어진다. 고요한 아침의 시간에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난다
2025년 10월 19일
휴일 아침에
◀ 김 종 걸 ▶
○ 격 월간지 〈그린에세이〉 신인상으로 등단
○ 작품집
수필집 : 〈울어도 괜찮아〉(2024)
공 저 : 〈언론이 선정한 한국의 명 수필〉(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