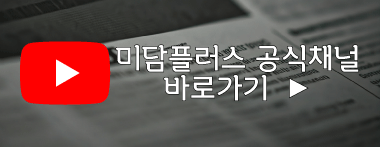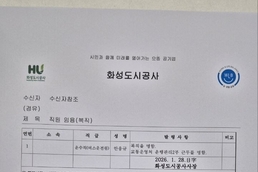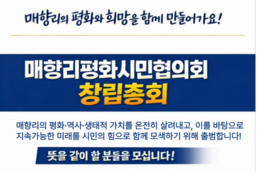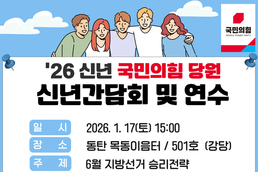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 이름 모를 꽃향기가 묻어온다. 그 향기만으로도 지나간 세월이 불려 나온다. 설렘과 아쉬움과 그리움이 겹치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나도 모르게 살아온 날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요즘은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대신 가족과의 거리는 가까워졌다. 외식 대신 집밥, 회사 대신 재택근무, 모든 생활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자연스레 글을 쓰는 일도 잦아졌으나, 글은 예전보다 더 어렵다. 문우들과 만나면 “멋모르고 쓰던 시절이 좋았다”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늘 어머니의 모습이 먼저다. 새벽녘 잠에서 설핏 깨어 보면 어머니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문을 열고 내다보면 우물가에 앉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 귀 기울이면 늘 자식들의 앞날을 비는 기도였다. 나는 그 기도와 눈물 젖은 고구마를 먹으며 자랐다. 당시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란 아이는 아니었지만, 존중과 인정 속에 귀하게 자랐다.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시대를 앞서 계셨던 분이다. 덕분에 나는 자식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았다.
어린 날의 꿈은 선생님이었다. 중학교를 마치자 꿈은 멀어졌다. 내가 처한 환경이 문제였다.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은 곧 대학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우리 집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마침 국립**기계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수업료 3년 전액 무료에 기숙사 생활,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보장되는 학교였다. 나라에서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를 길러낸다고 했다. 가난한 수재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나도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학교 뒤뜰로 불러 말씀하셨다.
“종걸아, 너 같은 아이가 왜 공고에 가려고 하니? 너는 꼭 서울대학에 가야 할 재목이다. 나중에 후회한다.”
선생님의 그 간곡한 말씀에도 귀를 닫았다. 부모님을 하루라도 빨리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길이 내게는 현실적이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스스로 지레 주저앉은 셈이었다.
고등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다. 처음엔 기숙사에 들어갔으나 군대보다 더 빡빡한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통학으로 전환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13km. 새벽에 일어나 5km쯤 걸어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했다. 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온 힘을 쏟아야 했지만, 마음은 늘 허기졌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 안의 외침은 점점 더 커졌다. 졸업 후 취업, 그다음엔 인생이 뻔히 보여 그 길이 두려웠다. 결국 잘못된 선택임을 인정해야 했다. 뒤늦게 대학 공부를 시작했다.
당시 실업계와 인문계의 간극은 너무 컸다. 영어와 수학은 특히 힘겨웠다. 단과 학원에 다니며 필사적으로 따라갔지만 늘 벅찼다. 몸부림치듯 공부하다 보니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도 꿈속에서 늘 시험과 쫓김에 시달리곤 했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인문계로 가겠다며 학교 자퇴를 결심했을 때, 나도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부모님께 다시 학교를 옮기겠다는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결국 체념하듯 학교에 다녔다. 대신 스스로 다짐했다. “또 다른 길이 있겠지.”
그 다짐은 오랫동안 나를 지탱했다. 인생은 갈림길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 몇 년 차이일 뿐이지만, 그 몇 년의 선택이 내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다. 모든 결과는 결국 내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스스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다. 돌아보면 내 삶은 다듬어진 글이 아니라 미완의 원고다. 매끄럽지 않고, 중간중간 문장이 끊기며 얼룩도 진다. 그 불완전함 속에 오히려 삶의 진실이 있다.
오늘도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는다. 흰빛이 온몸을 감싸며 포근히 스며들고, 창 너머 바람은 정겹게 속삭인다. 앞산의 초록 물결은 햇볕에 그을린 여름을 밀어내듯 출렁인다. 또 다른 길을 향하여, 오늘도 내 삶의 자취를 조용히 써 내려간다.
25. 09. 21
일요일 휴식 시간에
◀ 김 종 걸 ▶
○ 격 월간지 〈그린에세이〉 신인상으로 등단
○ 작품집
수필집 : 〈울어도 괜찮아〉(2024)
공 저 : 〈언론이 선정한 한국의 명 수필〉(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