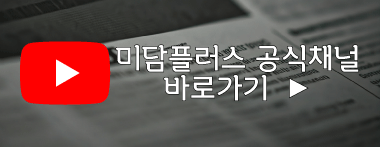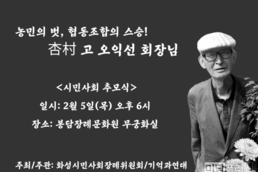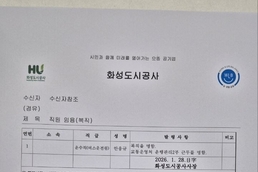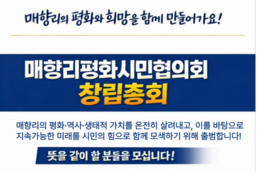처서가 지나고부터 한결 서늘해졌건만 한낮의 따가운 햇볕은 은총으로 느껴진다. 열을 받아 축 늘어진 고추도 불그레하게 영글어 가며, 금방 다가올 가을을 맞이할 조짐이다. 들에서는 농민이 밭작물을 가꾸지만, 자연과 함께하지 않으면, 허사가 돼버린다. 농사도 자연과 인연이 돈독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협치해야만 정국을 잘 이끌 수 있는 정치풍토와 비슷하다.
콩밭에선 콩잎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고 식물은 노란색으로 변신을 꾀하기 위해 성장 세포 생성을 차단하며, 몸에 지닌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돌린다. 그래야만 결실을 볼 수 있다. 결실은 스스로 깊어지는 색이다. 그래서 황금빛은 그윽하면서도 쓸쓸하다.
해 질 녘 들길로 나가면 바람결에 황금빛 벼 이삭이 서로 몸을 스치며 내는 나지막한 소리에 걸음을 멈춘다. 미세한 소리라서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맑고 소슬한 음향이다. 들판엔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풍요롭다. 두부모처럼 반듯하게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수만 평의 간척지 논에 통통하게 영근 벼 이삭들이 일으키는 파동은 장엄하다. 내가 지은 농사가 아니어도 대견하고 흐뭇해 절로 미소를 짓게 된다.
또 하루가 저물었다. 촌부의 가을밤은 무서우리만치 고요하고 쓸쓸하다. 고요함 속에서도 가끔 들려오는 소리는 헛헛한 마음을 달래주는 바람 소리와 벌레들 소리뿐이다. 그 소리는 자연이 만들어낸 소리이기에 시끄럽거나 싫증이 나지 않는다. 촌부는 그 고요함과 쓸쓸함에서 필연을 배운다. 삶과 죽음도 필연이기에.
이른 아침 길을 나서는 촌부에게 길섶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쑥부쟁이 꽃이 살짝 눈을 흘긴다. 욕심 부리지 마라. 마가 낀다. 안달하지 말고 기다려라. 설혹 잘된다고 해도 기고만장하지 마라. 그저 세상살이 넉넉하게 생각해야 편한 법이다. 오늘도 이슬 촉촉한 쑥부쟁이 꽃에 마음을 합장하며 촌부는 가을을 느낀다.
수필가 김종걸
격 월간지 〈그린에세이〉 신인상으로 등단.
현) 한국문인협회, 경기한국수필가협회, 그린에세이 작가회 회원.
현장경찰로 34년 근무 후, 경정(警正)으로 퇴직
<수상>
2014년 제17회 공무원문예대전(현, 공직문학상)수필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16년 제17회, 2018년 19회, 경찰문화대전 산문부문, 경찰청장상 수상.
2021년 경기한국수필가협회 수필공모 우수상.
2019년 대통령 녹조근정 훈장 수상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