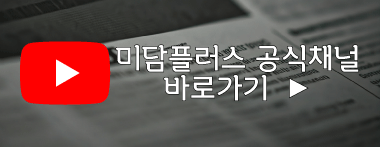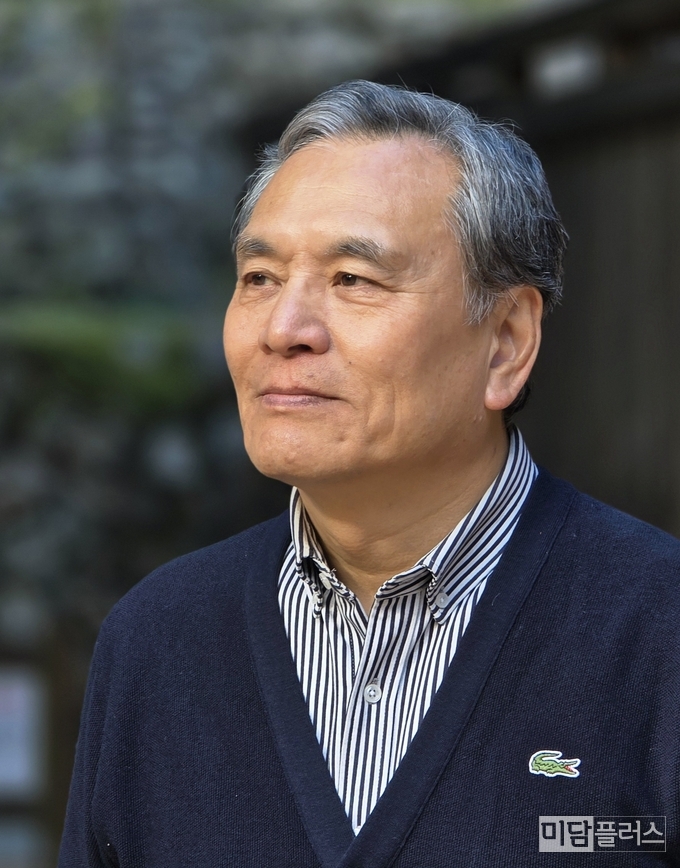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보장되는 시대다. 가정환경이나 지역,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제도처럼 보이지만, 나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시절, 상급학교에 합격하고도 입학금을 내지 못해 합격 통지서를 찢으며 울던 친구가 있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그 환경은 친구가 지녔던 미래의 꿈도 닫아버렸다. 아직도 그 친구의 얼굴을 생생히 기억한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던 모습이 내 마음까지 시리게 했으니까. 당시의 가난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꿈을 빼앗는 칼날이었다.
선생님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알면서 모질게 굴었다. 연중 몇 차례 가정 방문에 따뜻한 격려도 있었지만, 수업료 독촉은 여전했다. 부모님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우리들은 그 대화 속에서 숨죽이며 서 있어야만 했다. 심지어 교문 앞에서는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사실 집에 돈이 있어 일부러 내지 않을 학생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늘 가혹하게 대했다. 그 장면은 지금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당시 급식으로 나오던 성조기가 그리진 빵과 우유는 허기를 달래주는 음식이었지만, 동시에 치욕의 상징이기도 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늘 부끄럽고 속상했었다. 배가 고파 참으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차라리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그 시절, 우리에겐 질풍노도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고, 푸른 하늘마저 회색처럼 느껴졌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너무 높은 벽이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는 꺼트리지 않았고, 꿈은 늘 내 안에서 조용히 살아 있었다.
문득 내 어린 시절 꿈을 떠올린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이었다. 그 꿈을 키워준 이는 음악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다. 수수한 차림과 단정한 태도, 내면에서 흘러나오던 단아한 품위는 어린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처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늘 분노로 흔들리던 사춘기 소년에게 그 선생님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삶의 기준이자 길잡이였다. 하지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다.
집에는 반겨줄 사람이 없었고, 누렁이 한 마리만 꼬리를 흔들며 맞아줄 뿐이었다. 그래서 자주 산으로 올라갔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수지가 푸르게 넘실거렸다. 그 물결을 바라보며 서너 번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도 느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쉽게 실행할 수 없었다. 대신 분노와 허기를 달래기 위해 돌을 들어 물속으로 던졌다. 돌이 물보라를 일으킬 때마다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돌을 던지는 일도 오래가지 않았다. 혼자 하는 일은 곧 지루해졌기 때문이다. 그때 찾은 탈출구는 책이었다. 책을 읽고 또 읽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통째로 외우는 것이 더 쉽다고 여겼다. 처음에는 역사책을, 그다음에는 영어책을, 그리고 다른 과목 책들도 차례차례 외워나갔다. 당시 저수지에 돌을 던지며 책을 암송하는 일상은 내 삶을 지탱해 주는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독서의 습관은 지금까지 이어져 언제 어디서든 책을 가까이하게 한다. 사회생활에서도 매사에 모든 일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기에, 늘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했다. 하지만 독서와 글쓰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이어졌다. 책과 글쓰기는 여전히 가장 든든한 동반자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자 삶을 이어주는 친구였기에.
어느덧 세월이 흘러보니 그 시절은 단순히 힘들고 불행했던 시간만은 아니었다. 늘 이를 악물고 공부했기에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내 힘으로만 된 것’이라 착각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어머니마저 보내드린 후에야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곧바로 실행하는 직선적인 성격이었고, 어머니는 부지런하고 검소했다. 두 분 모두 성실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았다. 이러한 부모님의 정서가 내 안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늘 부모님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이젠 물질적 결핍에서 벗어나, 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안정도 얻었다. 살아오면서 남을 멸시하지 않았고, 가시 돋친 말로 누군가의 가슴을 찌른 적도 없다. 지금도 어린 시절의 꿈을 버리고 싶지 않기에 책을 읽고 글을 쓰며 꿈을 이어간다. 여전히 그 꿈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강단에 서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오랜 준비가 필요하고, 마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내 자식들이 삶의 무게로 인하여 가슴이 답답해 돌을 집어 던지고 싶을 만큼 아프지 않게, 조금은 더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 길을 이끌어 주는 것이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산 위에서 돌을 던지며 분노를 달래던 어린 소년이 이제 육십이 넘어 책장을 넘기며 웃는다. 이 아침, 돌이 물보라를 일으키던 순간처럼, 책 속 문장이 내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다. 결국 인생은 끝없는 여행이고, 오늘도 여전히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2025.11.23. 아침.
그해 겨울을 생각하며
◀ 김 종 걸 ▶
○ 격 월간지 〈그린에세이〉 신인상으로 등단
○ 작품집
수필집 : 〈울어도 괜찮아〉(2024)
공 저 : 〈언론이 선정한 한국의 명 수필〉(2022)